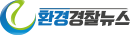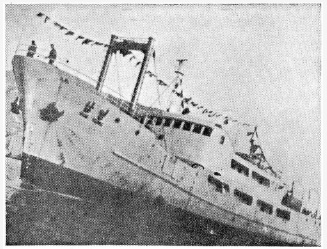
남영호 침몰사고는 1970년 12월 14일에 일어난 남영호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로 대한민국 역사상 해상에서 일어난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참사이다. 해양경찰의 무능한 사고 대처와 적재량 초과 등의 안전부주의, 이것을 감시 감독하지 못한 해운당국의 비리가 합쳐져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더구나 당시 군사정권의 횡포 때문에 현재까지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남영호는 부산과 제주를 정기적으로 왕복 운항하던 여객선이었다. 최대 정원이 321명, 최대 화물 적재량이 130톤인 철선으로 1968년 3월 5일 서귀포~성산포~부산간 노선을 첫 취항하였고 매달 10회씩 정기적으로 운행했다.
1970년 12월 14일 오후 5시경, 남영호는 제주 서귀항에서 승객과 선원 210명과 연말 성수기 판매를 위한 감귤을 싣고 제주 성산항에 들러 승객 128명과 화물을 추가로 실었다. 그리고 14일 밤 8시 10분경 부산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런데 선박회사는 3개의 화물창고에 모두 감귤 상자로 채우고도 모자라 선적이 금지된 앞 화물창고 덮개 위에 감귤 400여 상자를 더 쌓았다. 뿐만 아니라 중간 갑판 위에도 감귤 500여 상자를 더 실어 서귀항을 출항할 때부터 이미 선체의 중심이 15도쯤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풍랑으로 인해 한동안 배의 운항이 중지됐다가 풀린 상황이라 실어야 할 화물이 밀려있었고 이것을 이걸 무리하게 실은 것이다. 당시 감귤 상자는 지금의 골판지 상자가 아니라 나무 궤짝이었기 때문에 생존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 감귤 상자를 붙잡고 떠 있다가 구조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회사측은 성산항에 도착해서 다시 승객과 화물을 더 실었다.
당시 남영호는 정원이 321명(물론 선원까지 포함해서)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318명과 선원 20명 등 338명을 태워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거기에다 화물은 무려 540톤이나 실어서 적재 허용량을 4배 이상 초과했다.
이렇게 초과된 화물과 승객을 싣고 가던 중 남영호는 15일 새벽 1시 15분, 전남 여수에서 동남쪽으로 28마일(약 52km) 떨어진 해상에서 강풍을 만난다. 이 바람은 갑판 위에 쌓아놓은 감귤 상자를 쏟아지게 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선체가 넘어지며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난 신호를 받고 달려 온 것은 일본의 해경과 어선이었다. 한국 해경은 일본해안당국에서 전한 사고 소식을 무시했다. 한국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50분경에 다다라서 였다. 일본해경은 12명을 구조됐고, 한국 해경측은 고작 3명만 구출했다.
더군다나 당시 군사정권은 탑승자를 구조할 의지도 없었다. 사고발생 40시간 만에 탑승자들이 추위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짓고 이틀째엔 시신 수색을 중지했다. 사고 후 1주일이 지나 정부는 가라앉은 선체는 인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신은 최소 18구에서 최다 40구까지만 인양되었으며 나머지 300구는 찾지 못했다.
사고 후 정부는 정원초과 및 화물 과다적재 금지, 승객 명부 작성, 선장 권한 강화 등 '여객선 안전운항 수칙'을 전달했지만 해상 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남영호 침몰 사고 한달 후에도 1971년 1월 질자호 사고, 1972년 흥안호 사고, 1973년 한성호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1973년 12월 정부는 '여객선 운항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모든 선박마다 운항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1인당 40만 원씩 보상금을 주어 회유하려 했지만,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소송취하서에 서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시신 인양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부산과 제주에서 가두시위를 벌였고, 부산동부경찰서와 해운국에까지 몰려갔다. 심지어 정부 주최 희생자 위령제를 부수기도 했지만 당시 군사정권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진상규명은 흐지부지되었다. 세월이 흘러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공식 사과나 재조사조차 없다.
게다가 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도 부실했다. 사고 후 검찰은 선장, 선주, 하역업체 직원 등 총 12명만 최종 기소했고, 1972년 대법원 재판 결과 선장에겐 2년 6개월의 금고형이, 선주에겐 금고 6개월 및 벌금 3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하역업체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선주 집안이나 당시 정부 관련자들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사고 후 1971년 3월 서귀포항에 위령탑이 세워졌지만 방치되다 1990년대 들어서 언론의 보도로 위령탑 방치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측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령탑 이전 및 합동위령제 개최를 추진했다. 2013년 유족들을 중심으로 '남영호유족회'가 결성되어 12월에 처음으로 민관합동위령제를 지냈고, 2014년 동홍동 정방폭포에 신축 이전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고라 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